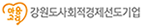무위당 난초그림과 아이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0 |
|---|---|---|---|
| 첨부파일 | 조회수 | 6,595 | |
|
사람 얼굴 닮은 난초 “이 그림은 부끄럼쟁이 태식이 얼굴 닮았네.” 벽에 걸린 난초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솔깃해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난초 그림과 태식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구동성으로 “정말 똑같네!”라고 말하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태식이 얼굴이 금세 빨개졌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 중앙동 밝음신협 건물 4층에 있는 무위당기념관 전시실에서 본 풍경입니다. 이날 기념관에는 ‘내 고장 인물 체험학습’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무위당 선생이 생전에 사용했던 지팡이와 모자 등 몇 가지 유품과 20여 점의 서화가 걸려있는 전시실에 들어선 아이들의 얼굴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붓글씨가 걸려 있는 작고 소박한 전시실을 휘 둘러보고는 속으로 ‘겨우 이걸 보러 왔나?’하면서 불만 섞인 표정을 짓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해설 하는 분의 설명은 귓등으로 들을 뿐,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장난을 치고, 참새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한문이 까막눈인 아이들에게 서예작품이 무슨 흥미가 있겠나 싶어 일견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떠들지 말라”는 인솔 교사의 꾸지람을 시들방귀로 여기던 아이들이 난초 그림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닮아 있는 난초 그림이 분방(奔放)한 아이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입니다. 수굿이 고개 숙인 겸손한 얼굴, 미소를 머금은 천진난만한 얼굴, 지그시 눈을 감고 골똘히 생각에 잠긴 부처님 같은 얼굴···. 난초 그림에서 사람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발견한 아이들의 얼굴엔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 간결한 붓 선으로 그린 난초에서 아이들은 부끄럼쟁이 친구, 태식이 얼굴을 읽어냈습니다. 무위당 선생은 생전에 난초를 즐겨 그렸습니다.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난초 그림은 대개 날카롭게 잎사귀가 서있습니다. 무위당의 난에는 날카로움이 없습니다. 난초들은 한결같이 낮은 곳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간결하고 상징적인 몇 가닥의 붓자국이 그대로 사람의 얼굴이 되어 웃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 부처의 모습이 됩니다. 고개 숙인 난초의 표정에는 고요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눈을 내리감고 생각에 잠긴 듯한 난초 그림에는 세상을 초탈한 깊은 사유가 담겨있습니다. 무위당의 난초 그림을 처음 본 사람은 여느 수묵화에서 본 난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사람 닮은 무위당의 난을 ‘의인란(擬人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 미술평론가는 무위당의 난(蘭)을 한국의 문인화 중에서 ‘추상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극찬하면서, 오늘날의 현대적 감각에도 잘 부합하는 조형미(造型美)를 지니고 있다고 평(評)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무위당기념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좌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무위당서화집에 수록돼 있는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똑같이 그려보는 모사(模寫)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위당 작품이 주는 푸근함과 간결한 붓 자국 때문일까요. 붓을 처음 든 아이들도 스스럼없이 쉽게 따라 그리더군요. 미술 강좌 수료식 날엔 어린이들이 모사한 난초 그림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자신이 따라 그린 난초 그림을 고사리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그림을 그린 할아버지 호(號)가 ‘조한알’이래요”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난초 그림을 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천지인(天地人)’이라고 서툴게 쓴 붓글씨가 마음에 쏙 들어 난초 그림과 바꾸었다는 선생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선생은 그 아이의 붓글씨를 서재 한쪽에 놓고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글씨 한번 보라고. 대단한 정성이 들어 있지 않아? 한 획 한 획에 들어가 있는 이 정성을 말이야. 거기다 때가 안 묻었잖아. 티가 없다 이 말이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잘 쓰고 잘 그리려는 마음보다는 모양이야 어떻듯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는 게 무위당이 생각하는 서예의 덕목이었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글씨가 추운 겨울 군고구마 리어카에서 본 ‘군고구마’라고 쓴 글씨보다도 못한, ‘먹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무위당은 재주피우지 않은 글씨, 정성이 깃든 글씨를 평생 쫓고 싶어 했습니다. 예쁘게만 쓴 글씨로 가득 찬 제자들의 붓글씨를 보면 “기교가 너무 많다. 더 덜어내야 한다”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뛰어난 기교란 어수룩해 보이는 법’이라는 대교약졸(大巧若拙)의 필법이 무위당 서화의 본질이고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면 위작(僞作)이 많이 나돌고 시중에서 매매될 만도 한데 지금까지 이런 소문을 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 생각하다 내린 결론은 무위당의 서화에는 대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위당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붓글씨와 그림을 두루두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지켜야 할 경구와 격언 또는 시구를 화선지에 담아 선물로 주었는데, 낙관 옆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어 넣었습니다. 선생의 작품은 받은 사람에겐 삶의 용기와 위안을 주는 부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작품을 집이나 사무실, 가게에 걸어놓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원주 시내에 있는 선생의 고향 후배들이 하는 밥집이나 가게에 가보면 벽에 걸린 선생의 서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위당은 자신의 서화를 예술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예술이란 미명하에 감춰진 희소성이니, 시장가격이니 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한살림 운동 자금마련과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해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은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돈을 받고 남에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날로 나는 붓을 꺾을 것이다” 선생은 이 단호한 결심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무릇 내가 난초를 그리고, 대나무를 그리고, 돌을 그리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고자 함이다.(凡吾畵蘭畵竹畵石 用以慰天下之勞人)’ 청나라 때의 문인화가 정판교의 글과도 맥이 통하는 무위당의 서도(書道) 자세입니다. 무위당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을 치되 반드시 난이 아니라 이 땅의 산야에 널려 있는 잡초에서부터 삼라만상이 다 난으로 되게 해서, 시나브로 난이 사람의 얼굴로 되다가 이윽고는 부처와 보살의 얼굴로 되게끔 쳐 보는 게 내 꿈일세.” 선생은 후기에 동자승 같기도 하고 웃는 아이 얼굴 같기도 한 난초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살고자 했던 선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성스런 고장을 가꾸어나갈 ‘무위당 꿈나무’들 단풍이 짙어가는 지난 늦가을 오후에 지인 몇 명과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무위당 선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로 향하는 조붓한 길을 걷다가 논두렁 옆에 서 있는 묘소 표지석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행 중 여성 한 분이 낭랑한 목소리로 표지석에 새겨진 무위당의 붓글씨를 나직이 따라 읽었습니다. 붓글씨 옆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강인한 들풀과 낮은 곳을 향해 고개 숙인 난초 잎을 함께 그려놓은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난초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한 그림 속에는 불의에 저항했던 무위당 선생의 기개도 엿보이고, 학생들에게 “참되자!”고 당부했던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도 어른거리고, 무위당기념관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도 겹쳐졌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난초 그림을 바라보았던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무위당 선생을 좀 더 일찍 알고, 그분의 예지를 흠모하면서 참되고 지혜로운 ‘무위당 꿈나무’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하라”, “밑으로 기어라”, “이 동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이 동네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무위당 선생의 어록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원주(原州)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지성스러움이 넘치는 고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묘소길로 향하는 쪽빛 하늘엔 높은 구름 하나 지나가고, 저만치 눈앞에 펼쳐지는 치악산에는 아이들 색동옷 같은 단풍이 곱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글. 김찬수 사진. 무위당기념관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