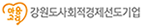스토리 에세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2 |
|---|---|---|---|
| 첨부파일 | 그렇다면_온실_속의_과일나무가_되겠어요.jpg | 조회수 | 2,320 |
|
그렇다면 온실 속의 과일나무가 되겠어요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서 잘 모르나본데요.” 얼마 전 지인이 불쑥 던진 말을 듣고 잠시 어안이 벙
벙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바람도 불지 않고 벌레도 찾지 않는 장소에서 자라난 연약한 식물’
처럼 보였다는 얘기다. 나의 어떤 면이 그런 식으로 비춰졌을까. 우리집이 온실이었다면 겨울마다
벽 사이로 스며드는 웃풍에 웅크리고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화초면 지는 어디 만주벌판에 솟아난
일송정 푸른 솔이라도 되는가. 이토록 몸서리치며 두고두고 불쾌한 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남들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학교 나와서 그럭저럭 돈벌이하며 지냈다. 물론 크고 작은 굴곡이야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시련
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항상 초연한 사람처럼 보이길 바랐다. 어떤 위기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압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의 저울이 대부분 평화 쪽에 기울어져 있었기에 당연히 위기 상황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했다. 굳이 이를테면 「세상에 이런 일이!」가 아닌 「전원일기」에 좀 더 가
까운 나날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침착은커녕 허둥지둥 회피하기 바빴다. 인정
하긴 싫지만 내가 화초임을 간파했던 그는 확실히 나보단 여유가 있어보였다. 그래, 일송정아. 힘
들게 살아서 넌 좋겠다. 그렇다면 ‘온실 속 화초’로서의 삶은 무의미할까? 언짢은 기분은 쓸데없는 고민으로 이어졌다. 적어도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보
이고 싶지 않았다. 짧은 번뇌 끝
에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그건
내가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다. 아무리 애써봤자 나의 태도
가 인생사를 모두 대변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니 생긴 대로 사는
수밖에. 며칠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다시
금 당시의 맥락을 되짚어보니 그
저 웃자고 한 소리였다. 물론 1급
소인배인 나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문득 후회스럽다. 그런
가보다 했다면 좋았을 걸. 다가
올 새해에는 보다 너그러운 사람
이 되고 싶다. 누가 나를 멋진 사
람이라 일컫지 않아도 쉽게 조급
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왕이면
앞으로는 화초 대신에 ‘온실 속
의 과일나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달콤한
열매를 선사하고 볕이 뜨거운 날
엔 소박한 그늘을 내어주기도 하
는 나무 말이다. 그러려면 아무
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일송정부터
용서해야겠다. 글 황진영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