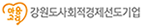김장이야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4 |
|---|---|---|---|
| 첨부파일 | [포맷변환]1552524904c6ef9e9c1f739ea7452a223b98f0511e.jpg | 조회수 | 4,126 |
|
오늘도 김치를 먹었습니다 “Do you know(두 유 노)” 시리즈를 아시나요? 한국인이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항상 질문하는 말을 모아놓은, 일종의 “너 (무엇을) 아니?”라고 묻는 유머입니다. “Do you know 연아킴?"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지성팍?”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Do you know 김치?”.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곧 김치요, 김치가 곧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인과 친숙해졌을까요? 김장이야기
삼국 시대에는 농경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곡류가 주식이 됨에 따라, 곡물의 소화를 쉽게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염분이 있는 채소류를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김치는 여러 가지 채소를 소금이나, 장, 술지게미, 식초 등에 절이는 방법으로 발달합니다. 고려 시대에는 김치에 들어가는 채소가 다양해지고, 물김치가 등장합니다. 향신료가 사용되었고 양념형 김치가 등장합니다. 또한 김장의 풍습이 시작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고추가 유입되면서 매운맛과 붉은색을 띤 김치가 자리 잡게 됩니다. 18세기 중반에는 통이 크고 속이 꽉 찬 결구형 배추가 중국을 통해 전래되어, 배추 속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는 통배추 김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배추는 포기 형태에 따라서 결구형, 반결구형, 비결구형으로 나눕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들어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조선배추(비결구형배추)와는 다른 품종의 호배추(결구배추)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배추는 속잎이 적은 것에 비해 호배추는 속잎이 꽉 찼습니다. 또한 호배추는 기존 배추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선 전역에서 호배추를 재배하기 시작하지만 그리 빨리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기존 배추에 비해 감칠맛이 적고 우거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조선배추가 널리 식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이 되어 상황이 바뀝니다. 값비싼 조선배추 대신 값싼 호배추가 더 많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호배추는 화학비료와 농약만 있으면 재배도 수월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 값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980년대가 되어 호배추로만 김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름도 호배추가 아닌 배추로 불리게 됩니다. 배추는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장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숙취 해소와 소화기, 폐, 간 등의 항암 기능 뿐만 아니라 향균 작용도 탁월합니다.  배추로만 김장을 하기 이전에는 주로 무를 절여서 김치로 담가 먹었습니다. 겨울철에 무로 담근 동치미를 김치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중요한 채소가 됩니다. 조선무는 깍두기나 각종 김치용 무로 쓰입니다. 둥글고 단단하며 윗부분 절반가량이 푸릅니다. 왜무는 단무지용 무로 조선무보다 푸른 부분이 적고 수분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하얗습니다. 열무는 어린 무로 주로 열무김치나 냉면, 비빔밥의 재료로 쓰입니다. 알타리무는 보통 총각무로 불립니다. 뿌리가 잘아 통째로 김치로 담가 먹습니다. 무는 사시사철 재배 가능하지만 보통 가을이 제철입니다. 비타민C와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소화제로 탁월합니다. 열을 내리게 하고 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고추는 임진왜란 전후하여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당시 남쪽 오랑캐가 전해준 매운 채소라는 의미로 ‘남만초南蠻椒’라고 하면서 ‘독이 있으며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 왜개자倭芥子라고 한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 일본으로 고추가 전해집니다. 김치에 고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김치 형태가 완성됩니다. 고추의 매운맛이 부패를 막고 짠맛을 젓갈의 부패를 줄입니다. 또한 초반 왜개자, 남만초, 번초蕃椒로 불리던 고추 명칭은 매운 향신료를 두루 일컬을 때 쓰인 ‘고초苦楚’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고춧가루나 고추장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이런 향신료는 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균하거나 살균합니다. 고추의 품종은 녹광형(일반계), 청양형, 꽈리형, 할라페뇨형, 오이형으로 나뉩니다. 녹광형은 매운맛이 약합니다. 청양형은 매운맛과 신맛이 강합니다. 꽈리형은 절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할라페뇨형은 매운맛이 적당하며 두껍습니다. 오이형은 매운맛이 약하고 맛과 향이 우수합니다.
지역성이 유지되었던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김치의 맛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주로 추운 북쪽 지방은 소금간을 싱겁게 하고 양념도 담백합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은 소금간을 세게 하고 빨갛고 진한 맛의 양념을 하여 국물을 적게 만듭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 김치의 예로 전라도 고들빼기, 개성 보쌈김치, 제주도는 동지김치 등이 있었으나 최근 교통, 통신이 발달한 점차 이런 지역차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김장’
2013년, 유네스코 무형위원회에서 김장문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장을 위해 다수가 모이고 김치를 나누는 행위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음이 공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김치가 아닌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김장철의 김장 문화입니다. 김장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채소가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진장珍藏, 침장沈藏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특히 겨울철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은 옛날에는 김장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중요한 생존수단이었습니다. 주로 늦가을, 입동 전후로 행해집니다. 배추와 무를 주재료로 두고 마늘, 파, 생강 같은 채소를 부재료로 씁니다. 여기에 소금, 젓갈, 고춧가루로 간을 맞춥니다. 통배추김치가 김장김치의 기본입니다. 김장을 끝내면 알맞은 온도를 유지시켜 오랫동안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김칫독을 땅에 묻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김장의 중요성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채소를 생산할 수 있고 가족 수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장은 겨울 전 중요 행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김치를 만들며 월동 준비를 하는 한반도만의 특별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곧잘 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식성이 변한건지, 나이가 든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익숙해져서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이 계속 김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도 김치를 먹었습니다. 글 이지은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