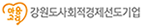우리가 몰랐던 정월대보름 이야기 [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2 |
|---|---|---|---|
| 첨부파일 | 이십일달.jpg | 조회수 | 4,063 |
|
사라져가는 풍속 ‘백가반’
지금은 사라진 정월대보름 풍속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곡밥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정확하게 왜 얻으러 다니는 지도 모르고, 오곡밥과 나물을 얻어 한곳에 모여 비빔밥으로 먹던 풍속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이 풍경은 사라졌지만 부럼 깨기 풍속과 오곡밥을 해 먹으며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백가반 ‘백가반’이란 여러 집에서 얻어온 밥을 먹는 정월대보름날 풍속이다. 전국적으로 행해진 대보름 풍속의 하나로 지역에 따라 대보름 전날 밤에 얻어먹기도 하고, 대보름날 아침에 얻어먹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백가반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쳇밥·조리밥 등 밥을 얻어오는 그릇에서 온 명칭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방 주술적 기능을 취해서 더우밥(무주)·버짐밥(청원)등으로 부르는 곳도 있고, 막연히 복밥(통영)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백가(百家)는 여러 집을 뜻하는 말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제삿밥을 나누어 먹는 옛 풍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아동 세시놀이로 간주된다. 밥을 얻는 행위나 개와 밥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본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되며, 절구통에 걸터앉거나 세 집 또는 세 성받이집에서 밥을 얻는 행위는 절구 또는 여럿이 가진 주력적인 힘을 빌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타성의 세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어야 좋다고 하고, 세성받이가 있는 집에서 오곡밥을 얻어다 먹어야 좋다고도 한다. 세성받이는 최소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성이 다른 집을 뜻하는 것이다. 적어도 결혼한 2대(代)가 한집에 살아야 한다. 얻어온 밥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먹는데, 대개 절구통 가에 걸터 앉아 먹는다. 친구들끼리 모여 함께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바가지나 체 또는 조리나 소쿠리를 들고 여러 집을 돌면서 오곡밥을 얻어온다. 백가반을 먹으면 그해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또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하며 병이 들어 몸이 마른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믿었다. 대구 달성에서는 방앗고가 동쪽으로 향한 디딜방아의 디딤 받침에 앉아서 먹고, 경남 통영에서는 방앗간에서 먹는다고 한다. 또 개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개에게 한 숟갈을 주고 자기도 한 숟갈을 먹고 하여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믿었다. 이처럼 동쪽으로 향한 디딜방아에 앉아 얻은 밥을 먹는 것은 곧 동쪽이 가지고 있는 양성(陽性)의 주력 등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남 진도 지역에서는 마치 걸인이 걸식을 하는 것처럼 남의 집 앞에 이르러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안 죽고 또 왔네” 하고 아이들이 각설이타령을 부르기도 한다. 아이들은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것을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다소 큰 아이들은 밥을 얻으러 다니는 대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창고나 마루에 차려놓은 오곡밥을 훔쳐 먹기도 한다.
오곡밥 다섯 가지 곡식, 즉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밥이다. 정월대보름의 오곡밥은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 농사밥이라고도 하며, 대보름 즈음에 먹는다 하여 보름밥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오곡잡반(五穀雜飯)이라 나온다. 또한 정월대보름에 만들어 먹는 상원절식으로 약밥을 들고 있는데, 약밥에 들어가는 잣, 대추, 밤 등은 당시 서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기 때문에 대신 오곡밥을 지어먹게 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월대보름날의 전통적인 절식(節食)인 오곡밥은 지역에따라 섞는 곡식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오곡밥을 먹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름날 먹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나흗날 먹고, 대보름날 아침에는 일찍 흰쌀밥(백반)을 먹는다. 밥을 아침 일찍 먹어야 농번기에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동국세시기』에는 “봄을 타서 살빛이 검어지고 야위는 아이는 대보름날 백 집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갈 먹이고 자기도 한 숟갈 먹으면 다시는 그런병을 앓지 않는다고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대보름날(또는 열나흗날) 다른 성(姓)을 가진 세 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해의 운이 좋아진다고 하여 여러 집의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소에게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이 오곡밥과 나물을 키에 차려주는데, 소가 오곡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자료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글·정리 원상호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