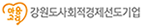정월대보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9 |
|---|---|---|---|
| 첨부파일 | [포맷변환]155296294402c336cfebfe888355466466dca98715.jpg | 조회수 | 4,052 |
|
정월대보름 농경이 기본인 우리 사회에서 달은 대지와 풍요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첫 보름달이 뜨는 시간에 축제를 벌였다. 축제는 대부분 밤에 이뤄지며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같은 바깥 행사와 집안에서 불을 켜놓고 밤을 새우는 실내 풍습 등이 전해진다. ‘달집태우기’는 생솔가지 등을 쌓아올린 무더기에 불을 질러 태우며 노는 풍속이다.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지만 쥐불놀이와 연관성을 가진 놀이다. 생솔가지나 솔잎, 나무나 짚을 모아 달집을 만들어 불을 지른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고, 빨갛게 불꽃이 피어오르면 신나게 농악을 치면서 불이다 타서 꺼질 때까지 춤을 추며 주위를 돌고 환성을 지른다. 달집이 탈 때 고루 잘 타오르면 풍년이고, 다 타고 넘어질 때 그 방향과 모습으로 흉풍을 점치기도 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동국세시기』(1849)에 “충청도 풍속에 떼를지어 횃불을 사르는데 이를 쥐불이라 한다.”는 ‘쥐불놀이’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현대에 접어들어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놓은 깡통을 이용했다면 이전에는 마른 쑥을 뭉쳐 묶거나 짚단을 사용해 불을 붙여 돌렸다. 이렇게 하면 논두렁의 잡초와 병충을 없애고 재가 거름이 되어 논두렁이 잘 여물어 농사에 도움이 된다. 이날 아침에는 호두나 땅콩, 잣 등을 나이만큼 부럼을 깬다. 또 귀밝이술(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을 마시고 일 년 내 좋은 소식을 들으며 더위를 팔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속신도 전해진다. 같은 의미로 묵은 나물을 먹기도 한다. 또한 풍년의 상징으로 보리, 쌀, 수수, 팥 등 다양한 곡물로 만든 오곡밥(찰밥)을 먹는다. 그리고 달불이1)와 닭울음점2), 소밥주기3) 등 그해 풍농을 이룰 것인가를 점치는 농점을 본다. 이밖에도 줄다리기를 할 때 이긴편 줄의 짚을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관운이 트고 일이 잘 된다고 한다. 개에게 밥을 먹이면 여름에 모기가 많이 괴고 마르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못 먹고 굶는 것을 ‘개 보름 쇠듯한다.’는 속담이 있다. 자료 한국민속대백과사전
 1) 대보름 전날(14일) 저녁 수수깡을 반으로 쪼개어 그 안에 콩 또는 곡식알을 평년에는 12개, 윤년에는 13개, 즉 그 해의 달수대로 넣고, 짚이나 실로 묶어 우물이나 물동이 속에 집어넣는다. 다음날인 대보름날 새벽에 그것을 꺼내어 실을 풀고 콩의 불은 상태를 보아 그 달의 수해 및 한해, 농작물의 풍흉을 점친다.즉, 5월의 콩이 불었으면 5월에 비가 내려서 모심기에 알맞고, 7월의 콩이 붇지 않았으면 7월에 가뭄이 있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또는, 콩이 잘 불은 달에 곡식이 잘 자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대보름날 꼭두새벽에 첫 번째 우는 닭의 소리를 기다려서 그 우는 횟수를 세는데, 닭 울음소리의 횟수가 적으면 흉년이 들고 열 번 이상을 넘겨 울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오곡밥과 나물을 차린 상을 외양간에 차리거나 오곡밥과 나물을 키에 담아 외양간에 놓아 소가 먹도록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막걸리를 부은 잔을 놓기도 하고 밥 대신 여러 가지 곡식을 놓기도 한다. 이때 소가 무엇을 먹는가를 살펴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 만약 소가 밥이나 곡식을 먼저 먹으면 그해 농사가 잘 될 것으로 여기며, 나물 등을 먼저 먹으면 농사가 좋지 않을 징조로 여긴다.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