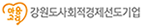스토리에서 보낸 편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6 |
|---|---|---|---|
| 첨부파일 | 무위당_생명_예술제.jpg | 조회수 | 3,755 |
|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
“좁쌀 한 알도 생명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좁쌀도 무시해선 안 되는 작은 생명이야 우리가 좁쌀이라 생각해봐 내가 좁쌀이라 생각해봐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이야 쪼롱쪼롱 시끄러운 작은 벌레도 최선을 다해 우는 작은 생명이야 우리가 벌레라고 생각해봐 내가 벌레라고 생각해봐 ~”
지난 5월 18일 오후 원주시 역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낭랑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주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 무위당 장일순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무위당 선생님의 어록으로 지은 동요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쓰고 우창수 무위당사람들 회원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날 역사박물관 야외마당에서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 25주기 생명협동문화제가 열렸는데, 어느 무대보다 뜨거운 갈채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노래와 율동에 그저 흐믓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리산 실상사 회주로 계신 도법스님의 추모강연도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불교의 ‘중도연기(中道緣起)’를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무위당 선생님의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이란 글귀를 보고 전율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무위당 선생님의 세계관과 정신을 바탕으로 무위당사람들이 우리 안의 냉전을 풀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장일순 평전 : 무위당의 아름다운 삶」을 집필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님도 출판 사인회와 짧은 인사말을 통해 무위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결함’이라며 이 시대 정치인, 지도자 등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무위당 선생님이 그리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평화와 연대를 꿈꾸며 몸소 몸으로 실천한 무위당의 삶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 좁쌀 한 알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원상호 여는 글 지난 5월 22일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25주기였습니다. 이 땅에 생명 협동운동의 주춧돌을 놓은 장일순 선생을 기리고자 원주시 일원에서 ‘생명협동문화제’가 열렸습니다. 2019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치악예술관과 무위당기념관, 원주역사박물관 등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무위당 선생은 살아생전 누구에게나 열려있었습니다. 윤형근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장일순 선생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찾는 사람은 누구라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지극함으로 따뜻하게 맞아 사람마다 그 서 있는 자리에 맞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곤 하셨다.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소중하게 여기라 하시며, 공무원에게는 민(民)을, 장사꾼에게는 손님들을 하늘처럼 섬기며 정성을 다하라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가르고 재물로만 모든 것을 재결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무위당 선생의 사람을 향한 곧은 마음가짐이 더 고결하게 느껴집니다. 해가 갈수록 유명작가의 베스트셀러 제목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요. 항상 주체적인 자세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객체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객체로 사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근간에는 분명 ‘받아들임’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위당 선생은 이럴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편, 이번 호에서는 무위당 장일순 25주기 행사를 비롯해 강원도 사회적 경제포럼과 일본 아웅 방문, ‘큰나무 사회적협동조합’과 ‘쿱드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낮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중 해가 가장 긴 하짓날을 지나면 2019년 상반기도 끄트머리에 다다릅니다. 이번 달, 다가올 하반기를 준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글 이지은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