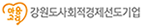원주 알아보기, 캠프롱 반세기 [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8 |
|---|---|---|---|
| 첨부파일 | 독일.jpg | 조회수 | 3,751 |
|
필리핀 미군기지 클락의 비극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은 당시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도움과 언론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결속력을 보여준 그날을 12차례에 걸쳐 당시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록으로 남긴다.
캠프롱 기지가 폐쇄된 지 벌써 10년째로 접어들었다.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반환 문제로 여전히 한·미, 원주시·국방부가 대척점에 서있다. 원주시는 665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여전히 반환되고 있지 않다. 반환이 된다고 해도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캠프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땅 미군기지 찾기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다. 뜨거운 여름 날 불덩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을 했고, 눈 내리는 혹한의 날씨도 시민들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년 여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이 포함됐지만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은 반환 후 국방부가 사용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원주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요동친다. 급기야 ‘원주 미군기지 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반환 문제는 기약이 없다. 얼마나 많은 부지가 오염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다면 해외 주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사례는 어땠을까? 1990년대 필리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폐쇄와 환경재앙 1991년 9월 16일 필리핀 미군기지는 모두 철수됐다. 클락 기지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철수를 마쳤고 수빅기지 역시 1992년 11월 15일 수빅 만에 걸렸던 성조기가 필리핀기로 교체되는 의식을 끝으로 철수하게 된다. 필리핀 정부는 1993년 3월 13일 수빅을 자유항(Subic Free Port)으로, 4월 3일 클락을 특별경제구역(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선언하고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하지만 수 많은 논쟁과 대안 가운데 미군기지로 인해 일어났을 ‘환경문제’에 주목하지 못했다.
캄콤(CABCOM·Clark Air Base Command)의 비극 1991년 6월 12일 팜팡가 지역의 피나투보 화산폭발로 클락 미군기지까지 파괴되면서 미군은 서둘러 철수한다. 화산 폭발로 인해 피나투보 산에 살던 원주민 등 2만여 세대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철수한 기지 안의 캄콤에 난민촌을 만든다. 7,000여 세대가 천막이나 미군이 사용했던 막사 등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203개의 펌프 우물을 파 이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했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난민들은 물에 기름이 뜨고 색이 이상하며 냄새도 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안 이 없기에 그 물로 생활을 했다. 어느날부터 캄콤안 아이들은 자꾸만 아프기 시작했고, 태어난 지 2, 3일 만에 아이들은 고열과 설사를 앓다 죽어가고 임산부들의 유산이 잦아졌다. 다른 곳으로 이주한 뒤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고 걷거나 서지도 못했다. 클락의 미군기지 독극물 희생자 조직은 2003년 328명이 기지의 독극물로 인해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사된것만으로 195명의 사망자가 카운트되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군은 기지를 이용할 때 별다른 주의 없이 위험물질들을 다뤄왔고 해충을 방지한다며 자주 대량으로 주위 마을에 살충제를 살포했다. 특히 화산 폭발이 이뤄지면서 대부분의 독성화학물질이나 위험물질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땅에 묻은채 떠났다. 국제 민간단체 등의 조사 결과 수빅의 19개 싸이트, 클락의 27개 싸이트가 독극물로 오염되어 있음이 나타나게 된다. 미 국방성은 이미 수빅 기지의 DRMS(D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Service)에 6만 갤런의 폐유, 화학물질 폐기물등을 버렸다고 했고 92년 발표된 GAO 보고서에선 미군이 위험물질을 다룰 때에도 어떤 환경기준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미군이 사용했던 클락과 수빅 기지에 대규모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희생자들로부터, 각종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미국 정부는 물론 필리핀 정부조차도 때때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1992년 클린터 미 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해 “기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그 사실에 근거해 논의를 해 보겠다”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지만 이후 묻히고 말았다. 필리핀은 2000년 공식적으로 기지 안의 독극물 오염에 관해 인정하고 미국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필리핀과 미국은 환경과 건강에 관한 상호협약을 하고 필리핀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이 협약에 전 기지의 오염문제는 빠져 버렸다.
독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1998년 3월에 개정된 NATO-SOFA 독일보충협정(SA) 53조에 따라 독일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 미군이 독일법상 규제되는 행위를 할 때는 독일당국의 허가를 받는 다는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미군은 평상시 군사 활동에 독일 환경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수의 경우는 직접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주로 식수를 생수로 공급 받아 먹고 있는 주한미군과 차이가 난다. 독일법은 미국군사주둔시설과 연관된 곳 어디서나 적용되며, 독일환경법은 FGS의 환경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NATO-SOFA의 보충협정의 환경조항에 따라 주독미군 환경집행부는 독일법의 기준에 따라 환경 관리와 감독을 한다. 독일 내의 모든 미군시설에 대한 행위 시에도 독일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독미군은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모든 필요한 정보를 독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독일 내 반환된 미군기지 사례 독일은 반환미군기지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각 기지마다 별도의 협정을 구체적으로 체결한다. 독일 내의 주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의 환경법과 다르고, 반환 예정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독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 정화 기준은 독일 연방 환경법과 독일 주 환경법의 기준을 따른다. 치유비용 규모는 기지별로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게는 약 1200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 정도이나 최고 약 60억 원 이내다.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인데, 독일은 평소 미군기지의 환경 관리를 독일 국내법에 의해 관리·감독해 오염이 발생하면 미군이 정화를 직접 하기 때문이다. 반환 된 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이 치유하는 경우도 있다.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 협정을 보면 반환 후 3년 이내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한 미군의 치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독일정부는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이 직접 신축이나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잔여가치를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환급액은 미·독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주독 미군의 시설기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독일 내 여타 미군기지 시설개선 사업비로 된다. 독일정부는 환급액을 독일 건설회사에 미군기지 시설 건설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기금은 국유재산관리청에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글 원상호 자료제공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 모임 원주 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참고자료 녹색연합 이미경 「반한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관한 연구정책 보고서」, 2009.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