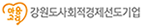특집 - 무위당 장일순 선생 25주기 생명협동문화제 [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7 |
|---|---|---|---|
| 첨부파일 | 김영현.jpg | 조회수 | 3,800 |
|
우리 교육을 살리는 생명·평화·협동정신  무위당 장일순 선생 25주기를 맞아 <우리 교육을 살리는 생명·평화·협동정신>을 주제로한 교육포럼이 지난 5월 18일 원주역사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7년 제가 오자마자 그동안 한살림 사업을 모아 모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가 함께 파트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서울시식생활센터에서 국장 역할을 하면서 국제 심포지엄 등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살림 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교육과 사업, 운동과 사업이 연결된 것입니다. 맨 처음 와서 보니까 식생활센터가 식생활위원회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이중화 되어 있었어요. 센터는 보다 전문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인식되었고, 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밥 교육도 하고 장난놀이도 하고, 농촌에 식구도 데려가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것처럼 지자체도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들이 들어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를 열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490억원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서 입찰도 하고, 용역도 하면서 식생활센터가 사업부서에서나 하는 일들을 병행했어요. 운 좋게도 7,000만 원, 5,000만 원이 선정됐습니다. 조직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식생활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이 넘는 사업들을진행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조직의 역량이었습니다. 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저와 두 분의 활동가 3명인데, 활동가 두 분이 이런 지자체 사업을 처음해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류 꾸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지난 경험을 되살려 1억1,500만 원 사업들을 조합원, 일반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참여자가 1만3,000명, 교육 참여자가 1만4,506명, 아이돌봄 이용건 수 80건, 한살림물품이용액 5,900만원을 소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강사 양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진로나 그 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30~40명이 있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20명도채 안되었는데, 논살림 센터가 들어와 올해 100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은 많습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곳곳에 활동가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GMO 인형극단이 하나 생기면서 학교로,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곳이 생겨서 한살림도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논살림 강사 분들이 20명 됩니다. 지금 양성되는 분들이 20여 명이니까 전체 100명의 활동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7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활동가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운동도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했는데 밖으로만 하지 말고 내부에 교육할 사람도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뭘까 하고 말입니다.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돈이 잖아요.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협이나 단체에 비해서 한살림이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예산 걱정은 안했지만 활동가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큰 과제였습니다. 센터 활동가 두 분은 지금 주경야독을 하고있습니다. 센터 내 두 분 모두 사범대를 나오셔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을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평생교육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한살림이 하는 교육과 네트워크는 지금 서울시에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한살림이 하려고 했던 지역 살림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경기도농촌진흥원과 생태논확장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한살림 생산자들과 논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살림 교육 같은 경우는 농림부나 서울시의 사업들을 실무자들과 같이 보고 센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생의주기별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영유아팀, 학교팀, 성인팀 등 생애주기별로 팀별 운영이 되어 있고 연구팀은 외부에서 한분 내부에서 더 많이 모셨어요. 특수학교 교육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수교육 관련된 선생님, 유아교육, 환경운동 하셨던 분들, 논문이나 책을 써봤던 분들과 같이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연구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보다 먼저 공공급식이라는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한살림서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을 제일먼저 도와준 단체이기도 하죠. 문래초등학교에서 한살림에 부탁해서 처음 친환경 급식을 했던 이력도 있고, 그런 활동의 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했던 공공급식은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공공적인 영역에 어떻게 생명의 먹을거리를 먹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도 한살림이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식생활 활동 활동가들이 교육을 합니다. 특히 학교 밖 아이들, 아이를 가진 엄마들, 특수학급, 중학교 자유학기제부터 시작해서 식생활관련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활동가들이 이해를 해야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것으로는 학교 밖 아이들, 한 예로 서울에 한국소아암백혈병협회가 있는데 그곳 아이들은 학교를 못갑니다. 계속 암 치료를 해야 하니까요. 그 아이들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었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한살림 안에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가보니까 아이쿱은 ‘공정무역’을 이야기 합니다.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넘어 삶을 생산하고 저희가 교육을 생산해서 한살림 교육도 이제 유기농 교육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선택해서 교육의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밥의 주제, 밥의 운동의 내용을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은, 사실은 사람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와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살림이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원춘식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