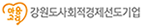원주 돌아보기 [2] 법천사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30 |
|---|---|---|---|
| 첨부파일 | 법천사지.jpg | 조회수 | 2,951 |
|
님을 부르는 애절한 곳
 님을 부르는 애절한 곳, 법천사지(法泉寺址, 사적 제466호) 흥원창을 뒤로 하고 잠시 온 길을 되돌아 견훤로를 따라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 이정표를 따라 법후로에 들어선다. 10여 분을 달리다 다시 법천사지 이정표를 만나 오른쪽 마을 도로인 ‘법천사지길’에 들어서니 멀리 노란 보리밭이 눈에 띈다. 그사이 법천사지 인근에는 연못이 조성되고 화장실과 주차장도 마련돼 있었다. 발굴 터에는 개망초가 어린아이 키 만큼 자라 마치 눈꽃이 핀 듯 희어, 발굴 터를 가렸다. 부론면 명봉산 기슭에 있는 법천사지(法泉寺址, 사적 제466호)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의 문헌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법천사(法泉寺)는 신라 말인 8세기에 산지가람(山地伽藍)으로 세워져 고려시대에 대대적으로 중창(重創)된 사찰이다. 화엄종(華嚴宗)과 더불어 고려시대 양대 종단이었던 법상종(法相宗)의 고승 정현(鼎賢)이 주지를 맡아 법상종 사찰로 번성하였다. 특히 지광국사(智光國師)가 초년(初年)에 수학하고 은퇴하여 머물다 입적(入寂)한 곳이므로, 이 시기가 전성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이 이곳에서 강학(講學)하였으며,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 강효문(康孝文), 서거정(徐居正) 등의 학자들이 여기 모여 시를 읊고 시문을 남겼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전소된 뒤 중창되지 못하였다.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시도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8월 31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6호로 승격되었다. ‘진리[법(法)]가 샘물처럼 솟는다’는 뜻을 지닌 법천사(法泉寺)는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창건되어 법고사라고 불렸으며, 고려 문종 때 지광국사가 머물면서 큰 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 중기의 문장가이자 혁명가인 교산 허균은 『원주 법천사기』를 남겼다.
원주의 남쪽 50리 되는 곳에 산이 있는데 비봉산(飛鳳山)이라고 하며, 그 산 아래 절이 있어 법천사라고 하는데 신라의 옛 사찰이다. (······) 금년 가을에 휴가를 얻어 여기 와 얼마 동안 있었는데, 마침 지관이라는 승려가 묘암(墓菴)으로 나를 찾아왔다. 기축년에 일찍이 법천사에서 1년간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흥(遊興)이 솟아나 지관을 이끌고 새벽밥을 먹고 일찍 길을 나섰다. 험준한 두멧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 이른바 명봉산에 이르니, 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봉우리가 넷인데 서로 마주 보는 모습이 새가 나는 듯하였다. 개천 둘이 동과 서에서 흘러나와 동구(洞口)에서 합쳐져 하나를 이루었는데, 절은 바로 그 한가운데에 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리에 불타서 겨우 그 터만 남았으며, 무너진 주춧돌이 토끼나 사슴 따위가 다니는 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비석은 반 동강이 난 채 잡초 사이에 묻혀 있었다. 살펴보니 고려의 승려 지광의 탑비였다. 문장이 심오하고 필치는 굳세었으나 누가 짓고 누가 쓴 것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실로 오래되고 기이한 것이었다. 나는 해가 저물도록 어루만지며 탁본을 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중이 말하기를 “이 절은 대단히 커서 당시에는 상주한 이가 수백이었지만, 제가 일찍이 살던 선당(禪堂)이란 곳은 지금 찾아보려 해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였다. 허균이 살았던 당시에도 폐허가 되었던 법천사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폐사지로 있다가 발굴이 시작됐다.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헤아릴 길이 없는 노목을 지나서 왼쪽으로 구부러진 산길을 한참 오르면 여러 가지 석물과 함께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오늘날 절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석불만 남은 이 절에서 당대의 제일가는 고승 지광국사가 출가하고 열반에 들었다. 고려시대의 빼어난 문화유산인 지광국사현묘탑비는 높이 4.55m이며 비신의 높이는 295㎝, 너비는 141㎝로 1085년(선종 2)에 건립되었다. 고려시대 석비의 대표작이라고 꼽힐 만큼 그 조각이 정교하기 이를 데 없고 화려하다. 지대석 위에 거북이 올라앉았고, 목을 길게 뺀 채 서쪽을 응시하는 듯한 용머리에는 물고기 비늘이 조각되었으며, 거북의 등에는 임금 왕(王) 자가 수놓아져 있다. 비신 옆면에 운룡을 깊이 새겼는데 지금이라도 날아오를 듯이 사실적이다. (출처 :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8 : 강원도)
우리나라 사찰 건물지 유적 중 최다 건물 보유 2013년 11월 21일 이곳 법천사지에서는 작은 브리핑이 있었다.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지현병)은 법천사 중심사역으로 추정되는 Ⅱ구역에 대한 8차 발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강원일보 11월21일자로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法泉寺址·사적 제466호)가 우리나라 사찰 건물지 유적 중 최다 규모의 건물을 지닌 대규모 사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천사가 언제 창건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 인화문 토기 조각과 당대(唐代) 월주요에서 생산된 청자 조각, 높이 5.6㎝인 9세기 말~10세기 초 고려 초기 금동불입상, 고려 중기 법천사 전성기의 고급 청자, 송대(宋代) 수입 자기와 송나라 동전, 법천사 중심 건물에 사용된 대형 치미 등의 유물도 발견됐다.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지현병)은 법천사 중심사역으로 추정되는 Ⅱ구역에 대한 8차 발굴 조사 결과 고려 중기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만든 40여개 동의 건물터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건물 수는 우리나라 사찰 건물 지 중 최다이며 법천사가 고려 왕실의 후원과 지방 호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조선 전기까지 법상종(法相宗)의 중심으로 번성한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터는 구역별로 일정한 숫자의 건물이 구역을 이루는 다원식(多院式) 가람 배치를 보여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관아 건물을 연상시키듯 좌우에 딸린 부속채인 익사(翼舍)를 거느린 대형 건물터도 조사됐다. 또 대형의 사각형 우물터와 개방식 배수시설, 석등 하대석으로 추정되는 연화대석, 탑과 공양보살상을 안치한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했다. 연구원 측은 각 건물터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 행되면 법천사의 창건에서 폐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9차 발굴조사 설명회를 열었는데, 당시에도 그 내용을 보도했다. 1,200여년 동안 감춰져 있던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의 본존불상을 안치한 중심건물 금당(金堂)이 모습을 드러냈다. 또 경전을 강의하거나 법을 설파하던 강당(講堂)을 비롯, 탑지 등 법천사지의 핵심 영역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지현병)은 6일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 현장에서 제9차 발굴조사 설명회를 열고 학계에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금당과 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금당지 전면에서 두 기의 탑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현병 원장은 “그동안 도로로 사용돼 발굴이 어려웠던 이번 중심 사역의 금당지와 강당지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놓여있다”며 “금당지 전면 동서에는 각각 탑지가 배치돼 쌍탑 1금당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금당에 탑이 두 개 있는 배치형식은 경주 불국사 등에서 볼 수 있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가람 구조로 법천사의 창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쪽 탑지 앞에서는 절 내 공양보살좌상이 앉았던 자리의 지대석으로 보이는 육각형 기단석이 발견됐고 중심사역 서쪽의 건물터는 공용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 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음이 확인됐다. 지 원장은 “이번 발굴조사 결과 중심사역이 처음으로 발견돼 고려시대 불교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고승 지광국사(智光國師, 984∼1067) 지광국사(智光國師, 984∼1067)는 원주 출신이며 속성은 원씨(元氏), 어릴적 이름은 수몽(水夢)이고, 해린(海麟)은 관웅 스님이 내린 법호다. 수몽은 어려서 이수겸에게 배우다가 출가의 뜻을 품고, 법천사 관웅 스님을 찾아가 수업을 받는다. 어느 날 관웅 스님을 따라간 곳은 개경 해안사(海安寺)였다. 이 절의 준광(俊光)스님께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으며, 용흥사 관단(官壇)에서 구족계를 받는다. 해린은 유식학(唯識學)을 공부하고 1001년 숭교사(崇敎寺)를 개창하면서 명성을 얻으니 그의 나이 18세였다. 후에 법상종(法相宗)의 교단을 이끄는 단초가 마련되는 셈이다. 비문에 따르면 해린의 천품과 그릇은 이미 부처님에 버금가는 큰 인물임을 적고 있어 그의 18세 명성에 품은 의구심을 가시게 한다. 해린은 젊은 나이여서 더욱 당당했을까. 1004년 21세에 대선에 급제했는데, “이때 법상(法床)에 앉아 불자(拂子)를 잡고 좌우로 한 번 휘두르니 가히 청중이 모여 앉은 걸상이 부러진 것 같았다”고 한다. 이에 임금은 해린을 찬양하고 대덕(大德)의 법계를 내린다. 이때부터 해린은 성종에서 문종에 이르는 다섯 왕을 거치며 대덕·대사·중대사(重大師)·승통(僧統, 1045년)의 법계(法界)를, 강진홍도(講眞弘道)·명료돈오(明了頓悟) 등 10개의 법호(또는 법칭)를 받는다. 문종은 직접 거동하여 수차례 거절하는 해린 스님을 개성 봉은사로 찾아와 왕사(王師, 1056년)와 국사(國師, 1058년)로 추대한다. “스님은 아무렇게나 말을 하여도 곧 도도하고 훌륭한 문장을 이루었으니, 혜거(惠據, 북송 때 문장가)의 문장력도 혼비백산하였고, 문장을 나누면 척척 음운에 맞았으니 담빙(曇憑, 중국 남안사람)의 음운학(音韻學) 실력도 부끄러워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서화·문장·필법에 정통하고 민첩함을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찬탄이 거듭된다. 역대 왕들은 자주 지광국사를 왕실로 초청해 『법화경』과 『유식학』 등의 법문을 들었고, 임금과 함께 어가(御駕)를 타고 다녔으며, 직접 백고좌 법회에 동참하는가 하면, 문종은 지광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자(師資)의 인연을 맺었으며, 넷째 아들(비문에는 第六子로 되어 있음)을 출가시켜 지광국사가 법을 펴던 현화사에 머물게 하니 그가 곧 대각국사 의천이다. 국사의 나이 84세(1067년). 당신의 명이 다했음을 안 지광국사는 처음 출가했던 법천사로 돌아와 머물다가 그해 10월 23일 열반에 든다. 문종은 시호를 지광(智光), 탑호를 현묘(玄妙)라 내리고 비문을 지으라 명했는데, 비문 짓기에 참여한 대신들은 중대부·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판상서·예형부사감·감수사·겸태자대전·상주국·신하 정유산 등이었다. 그들은 최고의 극찬과 명문장을 만들어 낸다. 고려사회를 빛내던 걸출한 한 선사의 일생이 부도와 부도비로 대체되었다. 당대와 후대를 아우르는 걸작이요, 후손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탄생한 것이다. 아름다운 절정, 영혼이 머문 자리 법천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돼 고려 시대에는 나라 안 최대 규모의 거찰로 융성했지만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천사지에는 조각 기법 등에서 가장 뛰어난 고려 탑비로 평가되는 국보 제59호 ‘지광국사탑비’와 도 문화재자료 제20호인 ‘당간지주’ 등의 문화재가 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진 뒤 2015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체·복원 작업 중인데, 2021년께 원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지광국사탑이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절정, 영혼이 머문 자리’라는 안내판과 함께 탑이 있던 자리만 덩그라니 남아있다. ‘아름다워서 슬픈 영혼을 위하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탑은 우리민족의 수난과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수탈되어 현해탄을 건넜고, 한국전쟁 때는 포탄에 온 몸이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쓰라린 역사에서 스님의 영혼이 어느 한 순간인들 편한 날이 있었으랴! 제 자리를 떠난 지 100여 년, 아름다워서 슬픈 탑과 탑비, 스님의 영혼이 이제 이곳에서 다시 만나 아픔이 영원히 치유되길 빈다’라는 설명이 있다. 지광국사탑은 1911년 9월 일본인 골동상 모리가 불법 반출하여, 실업가 와다 쓰네이치에게 매각했다가 1912년 5월, 후지타 헤이타로에게 다시 매각, 오사카로 밀반출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1912년 5월 조선 총독 데리우치의 반환 명령과 함께 같은 해 12월 총독부에 기증 형식으로 현해탄을 넘었다. 1915년 9월, 조선물산공진회에 전시, 그 후 명동성당 부근과 경회루 동편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전하는 아픔도 겪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폭으로 인해 옥개석 이상 대파(1만2,000 조각)한 것을 1957년 시멘트로 복원했다. 2005년 10월 안전상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시 제외돼 경복궁 내 고궁박물관 뜰에 존치했다가 2015년 3월 보존처리를 위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 복원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원주지역 시민들은 ‘원주문화재, 지광국사탑 환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9년 6월20일 문화재청은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현재 해체·복원 작업중인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광국사 탑과 탑비를 원래의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할지, 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에 탑을 이전 전시하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지광국사탑의 실제 이전 시점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웅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은 “전시관을 짓거나 보호각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광국사탑이 실제로 이전되는 것은 여건이 마련되는 2021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법천사지에는 옛 탑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당시 함께 조성된 지광국사 탑비(국보 제59호)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주를 떠난 문화재는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현묘탑을 비롯해 국보 제104호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보물 제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석관, 보물 제190호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보물 제358호 영전사지 본제존자탑, 보물 제463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등이다.
국보 제59호 지광국사현묘탑비 비의 몸돌은 크게 상단의 궁륭(穹窿)부, 전액(篆額)부, 그리고 내용을 적은 부분인 몸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몸돌에 새겨진 글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광국사 ‘해린(海隣)’이 수도한 내력과 불교의 도덕진리를 통달했다는 수행의 기록이 담겨 있고 뒷면에는 법천사의 내력과 탑비 건립과 관련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사적기(寺蹟記)의 기능도 함께 담고 있다. 이 비는 지광국사가 입적한 18년 후인 고려 선종 2년(1085년)에 당대의 문장이라 일컬어지던 정유산(鄭惟産)이 글을 짓고 명필 안민후(安民厚)가 구양순 해서체를 기본으로 쓰고 장자춘(張子春)과 이영보(李英輔)가 조각을 하였다고 비문에 새겨져 있다. 탑비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 아랫부분인 귀부(龜趺)를 보면 거북의 등에는 수없이 많은 임금 ‘왕(王)’ 자(字)가 일정한 구획을 이루고 있는 공간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거북등에 귀갑문뿐만 아닌 ‘王’자(字)가 조각된 경우는 다른 부도비의 귀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왕사(王師)였던 ‘지광국사’를 극진히 예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王’ 자(字)를 사용하는 경우는 임금과 용(龍)이다. 임금은 현세의 왕이며 용은 비와 물을 조절하며 불법을 수호하는 바다의 왕인 용왕인 것이다. 거북등에 ‘王’ 자(字)가 가득함은 귀부의 거북을 거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용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 선생님. 거북이가 헤엄을 치나 봐요. 옆에 물결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도 정확할 수 있을까.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금 교수님의 영향이었을까? 사모님도 뭔가를 보는 안목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왔지만 약국에서 일을 해본적도 없고, 약국을 운영해본 적도 없다는데, 이를 두고 “선생님 비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니, 약국을 할 시간이 없었지요”라고 말한다. “무슨 인연이었는지, 선생님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 함께 졸업식을 했어요. 그것도 인연인가봐요.” 처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지광국사현묘탑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수록 매력적이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힘차게 뻗어 오르는 용의 비늘과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모습에 입이 벌어진다. 거북등의 ‘왕’ 자 역시 예사롭지 않게만 보인다. 천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던 ‘지광국사현묘탑’은 언제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헤어진 지 어느 덧 100년이 훌쩍 넘었다.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럽게 금 교수님 부부가 내려온다. 팔을 잡아드리려고 해도 ‘이 정도는 아직 끄덕 없다’며 한사코 뿌리치신다. 정돈되지 않은 듯한 법천사 절터가 조금 아쉽다. ‘빈 절터에는 망초만 우뚝 자라고 있었네’라며 사모님께서 즉석 시를 읊으신다. 천상 시인이려나. ‘청산에서 살으리라-산촌일기’에서 사모님은 교수님께 ‘산이 웃고 있어요’라며 문자를 보냈는데, 교수님의 답장은 ‘당신은 시인이구려’ 였다.
불운의 천재시인 손곡 이달과 조선의 명장 임경업 장군 법천사지를 떠나 우리 일행은 손곡리로 들어선다. 손곡 이달 선생의 시비(詩碑)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곳에는 임경업장군 추모비도 있다고 하니 들려볼 심산이다. 법천사지에서 법후로를 따라 문막방면으로 10여분을 달리다 보면 길가에 자리 잡은 쉼터가 나그네를 반긴다. 이름하여 손곡시비 쉼터다. 손곡(蓀谷) 이달(李達, 1539~1612) 선생은 조선 중기 선조(宣祖) 때의 한시인(漢詩人)이다. 본관은 홍주(洪州, 지금의 홍성)이고,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이며, 동리(東里)·서담(西潭)이라고도 한다. 충청남도 홍주(지금의 홍성)에서 매성공(梅城公) 이기의 후손인 영종첨사 이수함(李秀咸)과 홍주 관기(官妓)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시의 대가로 문장과 시에 능하고 글씨에도 조예가 깊었으나, 신분적 한계로 벼슬은 한리학관(漢吏學官)에 그쳤다. 어려서부터 책읽기에 힘써 이백(李白)과 성당십이가(盛唐十二家)의 작품들을 모두 외울 정도였다. 시문에 뛰어난 정사룡(鄭士龍)과 박순(朴淳) 등의 문인(門人)으로, 특히 당시풍(唐詩風)의 시를 잘 지어 선조 때의 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삼당파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사화(士禍)와 당쟁,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어수선한 시대적 상황과 신분적 불만까지 겹쳐 젊은 시절의 시세계는 주로 방랑과 이별, 슬픔 등 인간 감정의 자연스런 발로를 중시하는 당풍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시적으로 승화시켜 초월의 경지를 보여주는 『산사(山寺)』 『강행(江行)』과 같은 명시를 남겼으며, 당시 서민들의 누추한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수요(拾穗謠)』 등의 정감어린 시를 지어 오늘날에도 공감을 얻고 있다.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벼슬길이 막힌 울분을 시문(詩文)으로 달래며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蓀谷里)에 은거해 호를 손곡이라 하고 제자교육으로 여생을 보냈다. 말년에는 허균(許筠)과 허난설헌(許蘭雪軒)을 가르쳤는데, 특히 허균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균은 스승인 이달이 훌륭한 재능을 지녔으나 서얼이기 때문에 불우하게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하여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설이 있다. 허균은 스승의 전기로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을 집필했다. 저서에 문집 『손곡시집(蓀谷詩集)』이 전한다. 이 문집은 제자 허균이 저본(底本)을 수집하고, 아들 이재영(李再榮)이 편찬해 1618년경 간행한 초간본으로 한시(漢詩) 330여 수가 실려 있다. 손곡 이달 선생은 서자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문과에 응시할 생각을 포기하였지만, 다른 서얼들처럼 잡과(雜科)에 응시하여 기술직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고,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었다. 그러나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였다. 한때 한리학관(漢吏學官)과 중국 사신을 맞는 접빈사의 종사관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달의 시는 신분제한에서 생기는 한(恨)과 애상(哀傷)을 기본정조로 하면서도, 따뜻한 정서가 무르녹아 있다. 근체시 가운데서도 절구(絶句)가 뛰어났다. 김만중(金萬重)은 『서포만필』에서 조선 시대의 오언절구 가운데 대표작으로 이달이 지은 「별이예장(別李禮長)」을 꼽았다. 허균은 「손곡산인전」에서, “그의 시는 맑고도 새로웠고, 아담하고도 고왔다[淸新雅麗]. 그 가운데 높이 이른 시는 왕유·맹호연·고적(高適)·잠삼(岑參) 등의 경지에 드나들면서, 유우석·전기(錢起)의 풍운을 잃지 않았다. 신라·고려 때부터 당나라의 시 를 배운 이들이 모두 그를 따르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이달은 일흔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평양 여관에 얹혀살다가 작고하였다. 무덤은 전해오지 않으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청 앞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손곡초등학교 입구에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시집으로 제자 허균이 엮은 『손곡집』(6권 1책)이 있다. 이밖에 최경창의 외당질 유형(柳珩)이 엮은 『서담집(西潭集)』이 있었으나 현재 확인되지 않고, 1623년 이수광(李睟光)이 지어준 서문만이 전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달 [李達]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2011. 11. 28.)] 손곡리(蓀谷里)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유배를 당하여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손위(遜位)하고 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손위실(遜位室)로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위’가 탁락되고 손곡이라 적었다고 한다. 또한 손곡 이달 선생이 살았다고 해서 손곡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아마 이달의 호 손곡은 손위실의 마을 이름을 따서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손곡시비(蓀谷詩碑)는 1983년 11월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웠으며, 손곡 선생의 시 한수가 새겨져 있다.
田家少婦無夜食 시골집 젊은 아낙 저녁거리가 없어서 雨中刈麥林中歸 빗속에 보리를 베어 숲을 지나 돌아오네 生薪帶濕煙不起 생섶은 습기 머금어 불도 붙지 않고 入門兒子啼牽衣 문에 들어서니 어린 자식이 옷을 끌며 우는구나
손곡 이달 선생 시비 오른쪽에는 임경업 장군 추모비가 서 있다. 이 비는 임경업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68년 8월 원주문화원에서 고증을 찾아 장군의 출생지인 생가 터에 세웠다. 임경업 장군(1594~1646)은 조선 중기의 명장(名將)으로 본관은 평택(平澤), 자(字)는 영백(英白), 호(號)는 고송(孤松)이다. 판서(判書) 임정(林整)의 7대 손으로 임황(林?)의 아들이다. 그의 출생지에 대해 충주 달천(達川)과 평안도 개천(价川)이 언급되고 있으나, 충북도지(忠北道誌)와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평촌마을의 전설, 현지 주민, 그리고 임씨 문중에서는 손곡리 태생임을 밝히고 있다. 1618년(광해군 10)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무인(武人)으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성공한 뒤에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나자 관군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願從功臣) 1등이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중군(中軍)으로 강화도까지 군사를 몰아갔으나 조선과 후금(後金)은 이미 형제의 의(義)를 맺은 뒤였다. 당시 건주위(建州衛)에서 일어난 후금은 명(明)나라를 합병할 야심을 갖고 있었고, 조선은 임진왜란의 원조와 대의명분 때문에 정객(政客)이나 친명파(親明派)들은 후금과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때 명나라 장군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이 후금으로 투항하였고, 이들 반장(叛將)을 토벌하기 위해 명나라에서 조선에 원병(援兵)을 청했을 때 임경업이 나아가 토벌하여 명나라 숭정황제(崇禎皇帝)는 총병(摠兵) 관직을 주기까지 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발하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으면서 압록강 맞은 편의 봉황산(鳳凰山)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백마산성(白馬山城)을 굳게 지켜 적의 진로를 둔화시키는데 전력하였다. 1638년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어 안주(安州)에 병영(兵營)을 설치하고 청나라의 동태를 살폈다. 1640년 청나라가 명나라의 금주(錦州)를 치게 되어 조선에 원병을 청해오자,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출전하게 했다. 그러나 친명파인 그는 대릉하 앞 석성도(石城島) 근처로 몰래 사람을 보내어 조선의 형세를 알리고 명군(明軍)과 협력하여 청군을 치려고 계획까지 세웠다. 이러한 모의는 청군에게 탄로되어 책망이 대단해지자 조정은 그를 잡아 올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머리를 깎고 장삼(長衫)을 걸친 후 스님 행세를 하였고, 한양 마포를 출발해 중국 해풍도(海豊島)에 표착하여서는 명나라에서 평로장군(平盧將軍) 벼슬을 내리고 4만의 병사를 이끌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나라는 마침내 북경을 함락시켰고, 청 태종은 산해관(山海關)으로 들어가니 임경업은 석성(石城)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 남경으로 옮긴 명나라는 곧 망하였고, 1645년 정월 명나라의 항장(降將) 마홍주(馬弘周)에게 잡혀 북경으로 압송되어 청나라 황제는 임경업에게 편발(編髮)하고 청에 귀순하라고 했으나 끝까지 버티다 북경옥(北京獄)에 갇히게 되었다. 1646년 6월 죄인의 몸으로 본국에 송환되어 그해 6월 20일 심기원(沈器遠) 옥사(獄事)의 연루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국법을 어겼다는 죄를 뒤집어 쓴 채 형리(刑吏)의 모진 매에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숨졌다. 1697년(숙종 23) 12월 숙종(肅宗)의 특명으로 복관(復官)되었고, 충주 충렬사(忠烈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계속)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