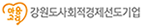스토리 에세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30 |
|---|---|---|---|
| 첨부파일 | 5.jpg | 조회수 | 2,836 |
|
지구가 좋아하는 이삿짐 싸기 “엄마 그건 힘들어”
“엄마! 아파트!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중학교에 가면서 딸아이는 이사 가자고 꾸준히 졸랐다. 엄마 껌딱지에서 홀로 존재하고 싶지만 주택은 무섭다는 것이 큰 이유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빈집이 썩어서 무너진 이처럼 골목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싫다고 했다. 나도 저녁회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빈집에서 훅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면 오래된 구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곤 해서 ‘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맘이 저절로 올라오던 참이기도 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올 때는 참 좋았다. 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골목의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짐 정리를 하다가 마루에 벌러덩 누워 있었다. 마당에 후드득 무엇인가 떨어지더니 후드득 후드득 소리가 집을 감싸며 돌아간다. 빗소리가 집 전체를 통해 전해진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듣던 빗소리는 모노스피커라면 이건 완전히 서라운드다. ‘이사 오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래된 집이지만 이 빗소리만으로도 충분한 거지’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며 나 혼자 흥분해서 짐 싸는 것도 잊고 빗소리를 들었다. 이사 날을 잡으니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있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그것도 평수를 줄여서 가려니 짐을 많이 줄여야 했다. 주택에는 창고가 있어서 짐이 제법 늘어나 있기도 했다. 이사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버려’이다. 잘 버리지 못하고 쌓아 놓고 사는 내 성정을 알아서 이기도 하지만 미니멀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는 듯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리 저리 구질구질하게 쌓여가는 것들을 버리고 마음도 짐도 관계도 단순해지고 싶어진다. 문제는 버린다는 것이다. 버리면 내 눈앞에서만 없어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좋아하는 이사를 해야지” “엄마 지구가 좋아한다고 머리 안 감는 거랑 같은 거면 싫은데 왠지” “그냥 마구 싹 쓸어버리지 않고 잘 분류해서 쓸 것은 쓰고” “응. 엄마는 그렇게 해” 이사는 짐을 싸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채린이 이거 버려?” “이렇게 새 건데?” “엄마! 이거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어. 심지어 있는 거 생각도 안했어. 그럼 안 쓰는 거야 왜 가져가?” 딸아이는 빠르게 자기 짐을 정리 해간다. 버리는데 고민이 없다. 나만 전전긍긍이다. 버리라고 내놓은 딸아이의 짐을 계속 미련을 두고 뒤적인다. 그러다 보니 늦어진다. 아직 쓸 만한데…쓸 만하다고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 쓸 만 하다고 쓰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로 버리기는 아깝다. 주변의 나눔을 알아봤다. 딸아이 옷, 장난감, 책들은 쉽게 나눔이 된다. 택배로도 보내고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자신 있게 버리더니 실제 버려지는 것은 별로 없네) 내 물건과 살림살이로 오니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래되고 낡고 요즘 거저 줘도 안 쓸 것 같은 잡동사니들이 가득하다. 산처럼 쌓여 있는 기분이다.
진도가 안 나간다.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다. ‘아니 뭐 이런…. 이게 다 쓰레기로 나가야 한다니’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 다시 살핀다. 혹시 쓸 수 있는 것이 없나. 결정장애 걸린 사람처럼 짐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다 쓰고 이삿날이 코앞에 닥쳤다.
“엄마! 엄마처럼 친환경 이사하다가는 이사 못가!” “딱히 친환경도 아니야. 그냥 내 짐에 내가 눌려서 답답해.” 버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버리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그렇다고 가져가도 둘 곳도 없고 딸아이 말대로 쟁여두고 쓰지 않을 것이 대부분이다. 코앞에 닥친 이사날짜가 나를 결단력 있는 여자로 변신시킨다. ‘이러다간 이사 못가지.’ 100리터 대형 쓰레기봉투를 펴고 담는다. 생각은 던져라. 몸만 움직여. 담고 또 담고. 작은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낡은 가구들도 다 폐기하기로 번개처럼 다 정리했다. 그렇게 짐은 정리할 수 있다. 그래 맘만 먹으면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미니멀라이프고 단순하게 사는 삶은 아닌 게다. ‘버려’, ‘비워’, ‘좀 버리고 살어’ 이 말을 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야 한다. ‘좀 쌓지 말고 살어’가 먼저다. 그래 좀 쌓지 말고 살자. 언젠가 미니멀라이프를 하기 위해 시골로 이사 가신 분의 얘기를 들었다. 스스로 재봉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농사를 지어 김치를 담그고 여간 부지런하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듣다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옷은 워낙 솜씨가 좋아 예쁘게 잘 만드는데 많이 만드신다. 미니멀일까? 싶었다. 많다는 것. 나 역시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했을까? 으앗~ 이게 뭐꼬…. 내 가슴을 친 것은 그 동안 받은 에코 상품들이다. 에코백이 6개, 행사에서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주는 물병이 7개, 친환경 비닐장갑, 장바구니 4개, 스테인리스 빨대 2개다. ‘에코백 = 예쁜 쓰레기’라고 하더니 우리 집 일이다. 무심코 받아서 넣어 놓고 바쁘게 살다보니 존재감은 잊었다. 이것들이 내 집에 있었구나. 필요를 잘 따지지 않고 예뻐서 혹은 다 주는 거니까 받는 것도 있다. 친환경 실천한다고 산 빨대도 두 번인가 쓰고 서랍에 고스란히 잠자고 있었다. 싸서 많아진 쓰레기들도 있다. 주로 딸아이 방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도 비껴가진 못한 것들. 다○소와 그 비슷한 가게에서 저렴한 플라스틱제품들을 판다. 중고생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가게다. 싸기 때문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튼튼하지 않아서 쉽게 망가져서 버려진다. 그런 플라스틱류가 100리터 한 봉지는 나온듯하다. 이제부터 내 집에는 이런 물건들은 들이지 않겠어! 가슴을 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주어 “그렇지, 채린아!” 뜬금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딸아이. 지구가 좋아하는 이사는 지구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폐소공포증 비슷한 답답함에 자다가 숨이 잘 안 쉬어진 적이 있다. 내가 엉망으로 만든 얽힌 실타래에 갇힌 꿈을 꾼 것 같았다. 엉키고 엉켜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우리집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세상으로, 다시 세상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우리집으로 얽혀 있다.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을 먹는다. 요새 우리 동네는 짜장면 그릇이 일회용으로 평정되었다. 모든 배달음식의 일회용화! 조국통일은 못해도 이런 통일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고 웬만한 저항세력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일회용 그릇을 설거지 하며 이젠 배달음식은 먹지 말자고 딸아이한테 말하면서 100% 지킬 수 있을까. 난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저 생활에서 조금씩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하다니.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는구나. 고맙습니다.
글 백송희 그림 백채린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