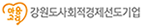스토리 에세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30 |
|---|---|---|---|
| 첨부파일 | 메트하임_604호.jpg | 조회수 | 2,428 |
|
메트하임 604호
 느지막이 일어나 에어컨을 켰다. 잠시 환기를 위해 연 창문으로 들어온 뜨거운 공기가 에어컨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보송보송한 아이보리색 린넨 이불 위에 앉아 프랑소와 오종 감독이 만든 <내 사적인 여자친구>를 틀었다. <영 앤 뷰티풀> 이후로 보는 그의 두 번째 영화였다. 왜 갑자기 그의 이름이 생각났을까. 아마, 그건 먼 기억 속 어딘가에서 다분히 ‘프랑스’스러운, 전혀 한국과는 상관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란 난생 처음 가 본 해외여행지이기도 하면서 친구들이 유학하고 있는 곳, 영화의 나라, 이 세상 모든 낭만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친근함과 그리움, 젠체하기 쉬운 과시의 공간. 그래서 그가 생각났다. 왜 영화 제목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알게 될 즈음 나는 어느 순간 더는 만나지 않게 된 사람이 생각났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자 영화 속 주인공이 그러했듯 어떤 사람에게 이입되어 있던 나의 욕망을 발견했다. 나의 욕망이란 늘 그런 식이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숨겨지다 마침내 드러났다. 영화 속 욕망의 종류는 젠더(Gender)였지만 나의 욕망은 젠더를 뺀 나머지였다. 특히 원하는 공간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컸다. 큰 창문으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보인다. 우울과 무기력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공간이 주는 행복의 시작이다. 사소한 날씨 변화도 재빨리 눈치 챌 수 있고 낮에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된다. 빨래도 잘 마른다. 몸이 찌뿌둥하면 일어나 청소기를 돌린다. 갑자기 졸리면 잠을 자고 또 깨면 책을 읽고 영화를 본다. 이제 메트하임 604호로 이사 온 지 2주 하고도 하루가 흘렀다. 처음부터 꼭 이사 오고 싶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딱히 불만은 없다. 온수 수압이 약하고 여닫이 창문이 45도 밖에 열리지 않아 환기가 느리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단지 나는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과 드럼세탁기, 에어컨, 옷장과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는 곳이 필요했다. 거기에 화이트 톤 벽지와 나무색 바닥, 마치 스크린처럼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과 창문 크기의 1/3 지점이 여닫이로 열리는 창을 원했다. 이 정도면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놓은 곡은 일본 피아니스트 하루카 나카무라(Haruka Nakamura)의 광(光)이다. 고요하고 평화롭다. 커튼을 연 자리에 파란 여름 하늘이 쉬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덧붙임) 2017년 7월에 메트하임 604호로 이사를 갔다. 이사 가기 몇 주 전 부터 사들인 가구와 소품은 충분히 공간의 질을 높였지만 그뿐이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와 먹고 마실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 없이 식사하는 것은 사자나 늑대의 삶이기 때문이다.”는 격언이 맴맴 돌았다. 혼자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나는 ‘혼삶’과 ‘혼밥’에 더는 재미를 붙이지 못했다. 결국 이듬해 봄, 그곳을 나왔다.  글 이지은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