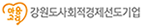농산물 이야기 [2] 인터뷰 - 이완용 농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3 |
|---|---|---|---|
| 첨부파일 | 농산물이야기3.jpg | 조회수 | 3,574 |
|
“매끈하고 단단한 유기농 애호박”
옥빛으로 일렁이는 이리천(二里川)과 나란히 달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에 도착했다. 열기로 후끈거리는 애호박 비닐하우스에서 27년 차 농부 이완용(64) 씨를 만났다. “우리도 날이 너무 더워서 아침 6시부터 11시 반까지 일하고 점심에는 좀 쉬었다가 4시 넘어서 다시 일해요.” 잠시 모자를 고쳐 쓰던 이 씨의 이마에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유기농 애호박 키우기 애호박. 된장찌개 끓일 때 빠지지 않는 채소다. 양파, 마늘만큼 친숙하다. 손바닥보다 약간 크며 길쭉하다. 겉은 매끄럽고 속은 단단하다. 껍질은 짙은 녹색이다. 같은 호박이지만 둥글 넙적한 단호박이나 늙은호박(청둥호박)과는 차이가 있다. 왠지 바닥을 짚고 호박이 열릴 것 같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예상과 다르다.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호박 줄기가 천장에서 매달린 집게에 걸려있다. 크고 거칠거칠한 호박잎이 고랑 위에 빼곡하다. 애호박을 어떻게 수확하냐는 물음에 이 씨가 직접 적과가위를 들고 꼭지를 자르는 시범을 보인다. 호박잎 사이로 이미 포장지에 싸인 애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수확 후 포장할 줄 알았는데 웬걸, 아예 포장지를 입은 채로 자라다니. “호박이 작을 때 미리 포장지를 씌어요. 그럼 자라면서 포장지에 딱 맞게 커요.” 애호박 재배가 어렵냐고 물었다. “제일 쉽죠.(웃음)” 27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농부의 여유 있는 대답이다. “초봄에 씨를 뿌리고 아주 심기 전에 비닐하우스 바닥에 점적관수를 만들어놔요. 이게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서 시작된 기술이에요.” 호박 줄기가 시작되는 바닥 부분에 정말 긴 관이 놓여있다. “전체를 안 적셔도 뿌리에서 필요한 만큼만 머금을 수 있게 해줘요. 여기에 거름도 같이 들어가요.” 천장에 물을 주는 스프링쿨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이다. 호박은 관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물을 뿌리로 빨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6월 말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 10월까지 수시로 거둬들여요.” 애호박은 8일 정도 지나면 웬만한 크기로 자란다. 호박 암수 구별 방법도 알려준다. “암꽃은 꽃과 호박이 같이 열리고 수꽃은 꽃만 피어요.” 애호박은 폭염 속에서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난다.
“노지에서 키운 호박은 채 썰어서 ‘말림용’으로만 나가요. 그래서 겉 포장이 없어요. 가격은 비닐하우스보다 저렴하지만, 맛은 똑같아요.”쉬러 왔다 눌러앉은 횡성이 씨는 용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중 1992년에 이곳(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으로 왔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휴양 차 5년 정도 지낼 생각으로 있자고 한 게 강원도 사람이 된거예요(웃음).”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 지금과 달리 15가지 이상 농작물을 재배했다. “집사람이 몇 해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 같이 일했는데... 한쪽 팔을 잃은 기분이지요. 그래서 품이 적게 드는 농작물을 찾다 애호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큼 단순한 작물이 아니더라고요.” 이 씨는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다. “첫째 딸은 출가했고 작은 딸은 취업해서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올 1월에 군대 갔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이 씨. 농사에 관심 있는 자녀가 있냐고 물었다. “내가 이 일을 썩 권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너무 농사를 홀대하니까. 다행히 나는 생협 덕분에 소비처가 있는데 보통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다 해야 되니깐 아무래도 힘들지요.” 막둥이 아들 소식을 물었다. “올해 1월에 입대했어요. 여기서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부대에 있어요.” 휴가도 곧잘 나온다고 한다. “둘째 딸은 영국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어요.” 상고를 나온 이 씨가 회계를 권했단다. “권하긴 했지만... 숫자 만지는 일이 그렇게 재밌진 않을 텐데...” 이 씨는 중장년층은 잘 쓰지 않는 아이폰을 쓰고 있다. “이거(아이폰) 쓴 지 한 8년 됐나? 딸이랑 페이스타임(아이폰끼리 가능한 영상통화 서비스) 하려고 쓰고 있어요.” 농촌의 하루 농촌에서 젊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하루 일과 끝나고 가족이나 친구랑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농촌)에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 씨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6시 부터 하루 10시간 씩 농사를 짓는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한낮은 비워두고 아침과 초저녁에 일한다. “저녁 있는 삶을 살기 어려워요. 요새 주52시간 얘기 나오잖아요. 농사를 그렇게 하면 밥 빌어먹고 살아요.(웃음)” 문화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점도 꼽는다. “예전에 해외 농업 선진지에 간 적 있어요. 그 쪽 농사꾼들은 여기와 다르게 문화 생활도 누리면서 잘 살더라고요.” 한때 이 씨는 취미로 색소폰을 불었다. “색소폰을 배워도 늦게까지 농사를 지으니깐 고단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이 씨는 직 접 유기농으로 키운 애호박을 생협에 납품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요즘 같이 농사가 어려울 때 만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농부의 바람 이 씨가 수확한 애호박이 한 상자 가득하다. 다른 상자에는 포장지가 없는 맨 애호박이 몇 개 들어있다 “포장지가 없는 것들은 작업하다 비닐포장을 놓친 것들이에요.” 멀쩡히 포장이 된 서너 개의 애호박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자라서 포장이 터진 것들이에요.” 자세히 보니 정말 포장지가 세로로 쭉 터져있다. “올해 애호박을 100개 수확했다고 하면 50개 정도가 이렇게 터져 버렸어요. 갑자기 크는 바람에요.” 올해이 씨가 키운 애호박은 한눈에 봐도 크고 굵으며 껍질이 매끈했다. “폭염 때문에 애호박 값이 떨어졌어요.” 애호박으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에서는 수확한 애호박을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몇 해 전 여름에 계속 비가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반대로 애호박 값이 폭등했어요.” 농사는 자연 앞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수확물 소득 보장 제도가 있으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씨의 말투와 표정은 옥계리 풍경을 꼭 닮았다. 여유롭고 차분하다. “내 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아스파라거스를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게 사람들 몸에 참 좋대요.” 농부의 시간은 벌써 내년 봄에 가 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농작물 이 큰 해 없이 잘 자라준다면야 더 바랄 것이 있나요.” 농부의 마음은 여전히 가족과 농사를 향했다.  글 이지은 사진 원춘식 <이 글은 로컬라이프 네 번째 이야기 (2018.09)에 실려 있습니다.>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