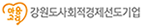〈원주에 사는 즐거움〉의 시작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23 |
|---|---|---|---|
| 첨부파일 | 원주에_사는_즐거움.jpg | 조회수 | 3,079 |
|
“나 때는 말이야~”
[밝음신협 파출 직원의 하루] “이 가방하고 저만 있으면 작은 은행이 되죠”
“안녕하세요?” 밝음신협 김한태 대리가 시원스런 눈매만큼이나 활기찬 인사를 던지며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를 만나기로 한 미용실은 김 대리가 맡고 있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곳. 취재를 당하게(?) 된 김 대리는 무척이나 쑥스러운 눈치. 하지만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의 손은 바쁘다. 통장에 입금할 금액을 적고, 돈을 받고, 도장을 찍고, 돈을 챙겨 가방에 넣는다. 그 모습이 하도 생경하여 그저 지켜보았다. 은행에서만 보던 일들이 은행이 아닌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기해 보였던 것이다. “저희 업무가 그래요. 은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입금도 하고 돈을 찾아달라고 하면 돈도 찾아 주고, 송금을 해달라고 하면 송금도 하고, 공과금도 받고.... 이 가방하고 저만 있으면 작은 은행이 되는 셈이죠.”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검은 가방을 두드리며 그가 말한다.  신협의 꽃, 파출 파출이라는 업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에서나 볼 수 있는 것. 대부분 바쁘게 장사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직원들을 내보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제도인 것이다. 밝음신협 23명의 직원들 가운데 현재 파출 직원은 모두 5명.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맡는데, 한번 맡게 되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하게 된다. “전 이제 입사한 지 12년 정도 되는데 처음 들어와서 5년 정도 이 일을 했다가 다시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네요. 8시 반에 출근해서 잔돈하고 수납장 준비해서 나가는 시간이 9시 정도 되고, 들어오는 시간은 대충 4시 반에서 5시 정도예요. 처음에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이제 몇 년 됐다고 그나마 점심 먹을 여유도 생겼죠.” 중앙시장과 자유상가, 지하상가 일대를 맡고 있다는 그는 매일같이 180집을 돈다. 미용실을 시작으로 그의 조합원 찾아다니기는 건어물 가게, 생선 가게, 닭집, 야채 가게, 반찬 가게, 떡집을 돌아 약국을 들러 처음 들어가 보는 중앙시장 이층에 자리한 금세공 사무실과 옷을 만드는 공장까지 숨 쉴 틈도 없었다. 북적대는 시장통 안에서 조합원 가게는 한곳도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욱 인상에 남았던 것은 주인이 건네주기도 전에 어느 집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럼없이 찾아내 펼치던 모습이었다. 금고 서랍에서, 혹은 한쪽 벽에 걸려 있는 작은 손가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장을 꺼내는 그의 모습이나 그런 그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조합원들의 모습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고, 가끔 낚아채듯 돈을 빼앗아(?) 입금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못 보던 얼굴 하나를 데리고 다니자 가는 곳마다 누구냐고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때마다 김 대리는 자기 일 잘 하는지 감시하러 나왔다고, 혹은 자지가 그만두게 되어 일을 가르치러 왔다고 농담을 한다. 수십 곳을 그렇게 다닐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즐겁게 답한다. “친구 같고, 옆집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아요” “3년 이상 거의 매일 만나다 보니 친구 같고, 옆집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아요. 많은 집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되다 보면 어느 집에 뭐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죠.” 그나마 김 대리가 맡고 있는 지역은 시장통 안에 밀집해 있어서 걸어 다녀도 되지만 다른 파출 직원들은 떨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다녀야 한단다. 한정된 시간 안에 매일 정해져 있는 조합원들을 다 만나려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하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따르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직원이 만나야 하는 조합원 수는 150여 명 정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김 대리를 쫓아다니기를 2시간. 우리는 겨우 짬을 내어 자유상가 지하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밥이 반가울 수가 없었다. 밥보다도 앉아서 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고마웠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일하면 힘들지 않냐고, 제일 힘든 일은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생각 할 시간도 없단다.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새로운 조합원들을 가입시키는 일도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180곳이나 다니다 보면 그것마저 쉬운 일이 아니라고. “ 이 파출이라는 게 비 오고 눈 오고 추우면 정말 하기 싫은데 날씨보다 더 안타까운 건 조합원들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동안 저희 신협도 사정이 좋지 못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묵묵히 기다려 주어 고맙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들을 믿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요.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죠.” 이렇게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에 모두들 어렵다는 요즘에도 밝음신협은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점심을 먹고 난 뒤, 지하상가와 다시 중앙시장을 돌아 점심시간이라 바빴을 식당가를 도는 순서가 남았다고 김 대리가 앞장선다. 또 다시 몇 시간을 걸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그래도 가뿐히 일어나 걸어가는 김 대리를 종종걸음으로 따라간다. 5시쯤 사무실로 돌아오면 김 대리는 더욱 바빠진다. 180여 곳이나 되는 상가를 돌며 수납장에 기록한 입금과 출금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 은행 창구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졌을 그 일을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8시. 올해로 8살, 3살이 되는 사내아이 둘을 두고 있다는 그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무척 미안하다. 하루 종일 다니느라 피곤해진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그저 누워서 쉬고 싶기 때문이다. 두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바빴을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짧지 않은 하루를 쫓아다니면서 매일같이 힘든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얼까 생각해 보았다. 그저 직장이기 때문에,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 김 대리와 조합원들 사이에는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이들이야말로 신협을 신협답게 만드는 신협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료제공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글·사진 박용숙(편집위원)
|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